1732년 4월 1일, 헝가리의 국경 가까운 시골 Rohrau에서 태어난 프란즈 조셉 하이든의 집안은 그를 포함해서 12형제, 목공을 업으로 하는 집안은 가난 했으나 양친은 모두 낙천적이었고 웃음 소리와 노래 소리가 끊일 날이 없는 행복한 집안이였다.
둘째 아들인 하이든도 물론 가난에 굴하지 않는 낙척전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교육가였던 아버지의 처남이 맡아서 음악 교육을 받게 했고, 8살 때에 빈의 스테판 성당의 아동합창대원이 되었다. 17살때 변성기가 시작 되엇 그 곳을 그만둔 하이든은 빈에서 거리의 악사들의 모임인 세레나드 악단원으로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사회와 세속적인 음악을 체험 했다.
그러다가 어떤 남작가의 바이올린 주자로 고용된 것을 비롯해서 나중에는 헝가리의 귀족 Esterhazy 공작의 궁정악장으로 30년을 봉직 했다. 그 당시의 음악가로서는 가장 안정 되고 영예로운 직업이었다. 그 동안에 그의 작품은 유럽 각지에서 출판 되어 명성을 떨쳤다.
1790년 영주가 세상을 떠나고 궁정악단이 해산 되어 하이든은 비로서 독립된 작곡가로 빈에 영주하기로 했으며 이때 그의 나이는 벌서 57세 – 독립하기엔 많이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모짜르트와 연령을 초월한 우정을 맺은 것도 바로 이때요, 시골에서 올라온 베토벤을 가르친 것도 바로 이때였다. 두 번에 걸친 런던 여행도, 그의 명작 ‘천지창조’와 ‘사계’ 그리고 그의 마지막 교향곡 104번 ‘런던’ 교향곡도 자유의 몸이 된 하이든이 빈에서 맛본 기쁜 일들이였다.
그리고 명실 그래도 전 유럽의 거장으로 군림한 그는 만천하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1809년 76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수한 그는 바흐가 별세한 1750년 전후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모짜르트의 짦은 인생의 활약을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모짜르가 간 뒤에도 18년이나 더 살았다. 그리고 하이든이 죽던 해, 37세의 베토벤은 교향곡 6번 ‘전원’까지 완성한 음악의 수도 빈의 대가였다.
하이든은 교향곡 형식을 완성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러나 물론 그는 교향곡의 창시자는 아니다. 교향곡의 완성까지에는 많은 인재의 노력이 쌓였으나 그 형식을 뛰어난 작품으로 실증해서 정착시킨 것은 역시 하이든이다. 그 정착 과정에서 하이든은 몇가지의 개혁을 했다. 그는 Manheim 악파가 결정한 4악장제를 전승해서 제 3악장에 전아한 무곡형식 미뉴엣을 채택했다. 그리고 1악장은 소나타 형식, 즉 대조적인 조성과 성격을 가진 제 1 테마와 제 2 테마가 소개 되는 제시부, 그리고 테마가 동기적인 발전을 보이는 전개부, 그리고 제 1 테마와 제 2 테마가 돌아오는 재현부로 구성되는 기악형식인데, 하이든은 특히 전개부의 처리를 비약적으로 발전 시켰다. 느린 속도의 제 2 악장에서 하이든은 민요나 동요의 멜로디를 으용해서 친밀감을 주게 했고, 제 3 악장에서는 향토색이 짙은 Landler (독인의 3박자 계총의 민요) 무곡풍을 가미해서 흥을 돋구었다. 제 4 악장은 론도 형긱이 아니면 소나타 형식을 썼는데 성격상으로는 무곡풍의 경쾌하고 명랑한 것으로 피날레의 만족감을 주도록 했다. 이런 모든 형식과 양식의 정착이 모두 하이든의 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당시 ‘새로운 음악’이던 교향곡이 150편, 현악 4중주 곡이 70편, 그 밖에 거룩한 종교음악로부터 영주의 식사 때마다 연주하는 ‘식탁음악’에 이르기까지 그 수효는 실로 방대하다. ‘인생은 심각하게, 그러나 예술은 즐겁게’라는 전제군주시대의 예술풍조는 작곡가로 하여금 왕후귀족이 식후에 먹는 신선한 과일처럼 음악을 생산케 했던 것이다 – 신성 로마제국, 에스테르하치 카란타의 공작 바울 안톤 각하 밑에서.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린 하이든에게 약간 어울리지 않는 아이러니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낙천적인 하이든의 천성은 명랑한 유모어를 금가루처럼 작품에 뿌렸고 그의 풍부한 악상과 실제의 경험에서 얻은 깊은 조예는 그의 작품으로 하여금 무리가 없고 유려한 음악의 흐름과 함께 무한한 친밀감을 주게 하고 있다. ‘파파 하이든’이라고 존경과 사람을 받던 그의 매력 있는 인품이 음악에 그대로 반영이 된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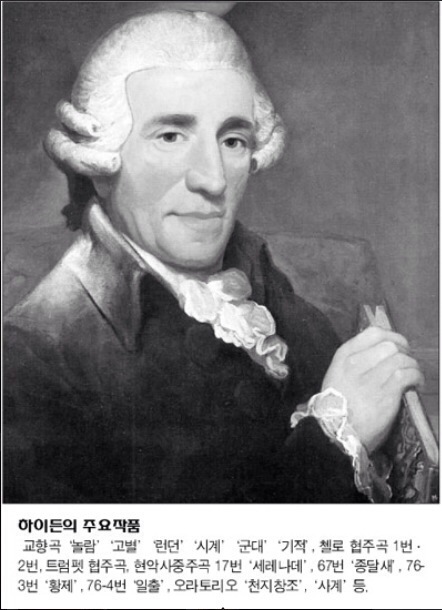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